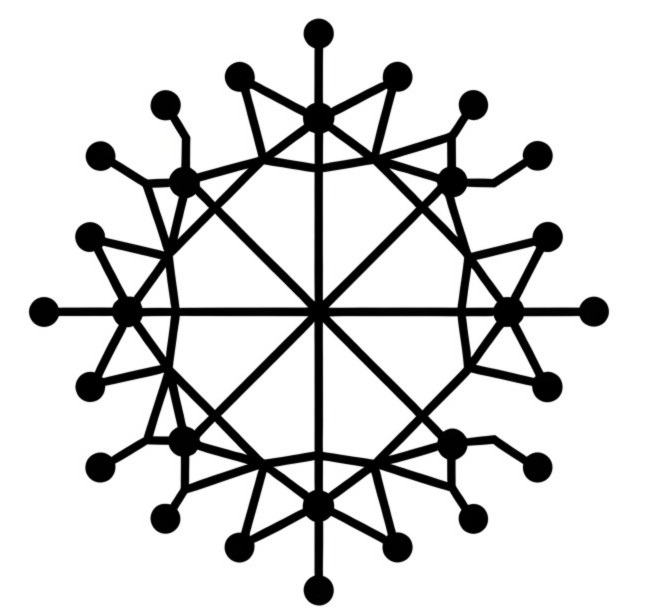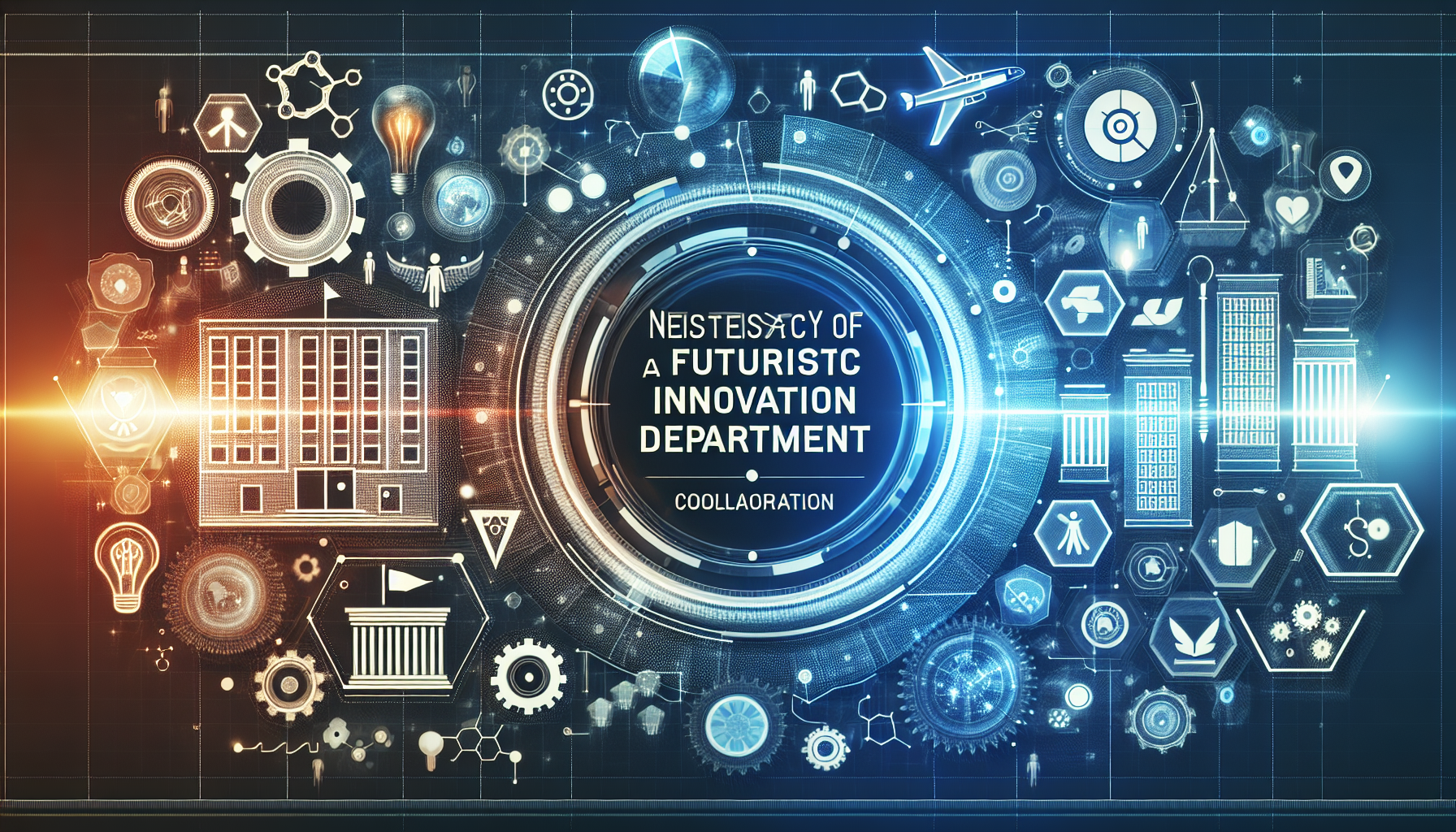AI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AI혁신부'의 필요성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조직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대학교 공익법학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 수단에서 혁신으로
최경진 교수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I 자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처가 아닌, AI를 활용해 국가 전반의 전환을 실행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들어, 새로운 조직이 가지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직: 'AI혁신부'의 출범 제안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AI혁신부'를 제안하며, 이 조직이 기술 이상을 넘어서는 초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서는 창업, 데이터, 인프라 관리에서부터 규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분야를 아우르며, AI가 사회 구조 개편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의 혁신, 규제의 혁신적 개편, 새로운 기술 창업의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혁신을 강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혁신을 위한 'CINO'형 조직
최 교수는 새로운 조직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다른 부처들을 혁신적으로 압박하는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보통신부 시절처럼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AI 혁신부는 시대정신에 맞춰 조직의 목적과 실행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의 정부 조직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AI 혁신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은 더 나은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현 시대의 디지털 요구에 부응하는 이러한 새로운 조직체계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앞으로 AI혁신부가 도입되어 어떠한 실천적 성과를 낼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